다른 나라, 같은 고민

- 이 글은 2019년 2월에 작성한 글입니다.
얼마 전에 KSAN(네덜란드 한국 학생회) 주최로 네덜란드에 있는 한국인 학생들에게 IT 업계의 업무 문화와 환경, 내가 하는 일, 그리고 머신러닝 등의 기술이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 지에 대해 얘기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기술보다는 ‘진로’에 초점을 맞춘 행사로, 나를 포함한 4명의 연사가 돌아가면서 본인들 분야 관련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마지막에 4명의 패널이 앞에 나와 질문/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다. 2시간 정도로 짧은 행사를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3시간이 훌쩍 넘을 정도로 길었고, 특히나 학생들의 질문들이 생각보다 구체적이고 많아서 시간이 꽤나 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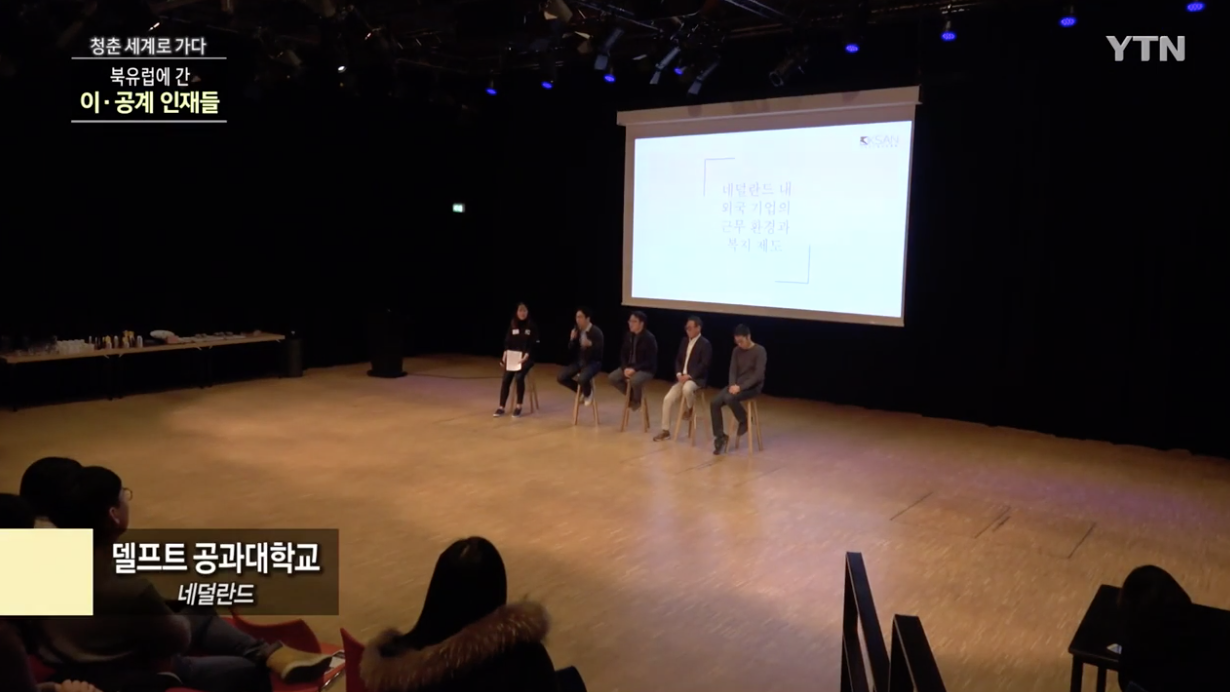
생각보다 간절하게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질문하는 친구들을 보고, ‘사회’에 대한 동경과 함께 두려움이 가득했던 12년 전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특히 해외에는 대규모로 신입사원을 뽑는 ‘공채’도 없고, 아시아인으로서 minority이기 때문에, 더 진로 고민이 ‘구체화’ 될 수 밖에 없다. ‘회사’만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을 하느냐에 대한 고민도 미리 많이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남학생의 경우는 ‘군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에, 군대를 다녀온 후 다시 해외로 나와 학업이나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고민을 많이 했을 수록, 네덜란드라는 나라(혹은 해외)에서 일하고 살고 싶은 생각이 강할수록, 진로에 대한 고민은 더 간절해 질 수 밖에 없다.
질문을 나에게 돌려봤다. 나는 왜 여기 나와 있을까? 한국에서 나름 직장생활 잘 하고 있었고, 거쳐온 회사들에서 능력/성과도 인정 받았다. 그러나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계속 달고 살았다. 직장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선 내 시간을 헌신해야 하는 문화. 허나 회사를 위해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했던 아버지 세대와 같이 살고 싶진 않았다. 그래서 더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삼성전자라는 껍데기를 벗으면 내 가치는 얼마 짜리일까?’와 같은 고민을 달고 살았다. 그러던 중 네덜란드에 있는 회사로 취업을 성공하여 이직과 함께 이민을 하게 되었다. 네덜란드라는 곳의 흔히 말하는 워라벨(Work life balance)는 확실히 보장되고, 미세먼지도 거의 없었다. ‘아이가 행복한 나라 세계 1위’. 보통의 한국인이라면 부러워할 가능성이 높은 환경이다.
하지만 이민 후 1년 반이 지난 지금 내 고민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여기서 얼마나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가슴에 품고 있다. 내가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은 편이긴 하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내 한 몸(이젠 내 한 가족) 챙길 사람은 나 뿐이다’ 마음가짐으로 18년을 살아왔다. 독기까진 아니지만 나름 열심히 살아왔고, 꾸준히 자기계발을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기회를 잡았다. 그러나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하고, 직장문화가 인간적인 네덜란드에 와서도 나는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 계속되는 긴장감은 젊을 때는 자기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내 진로 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챙겨야 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일찍 지쳐버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왜 그럴까? 나는 왜 계속 긴장을 놓지 않고 있을까?
첫번째 이유는 지극히 개인적이다. 유전적으로 폐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은데, 미세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내가, 그리고 내 (유전자를 받은) 아들이 사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는 정말로 ‘살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심리적인 배수진을 치고 있다.
두번째 이유 — 아마도 가장 큰 이유 — 는 아마도 나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계속 minority일 것이라는 생각 때문인 것 같다.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는 굉장히 international한 회사다. 실무자급(나는 Tech 부서에 있다)에서는 어림잡아 20~30% 정도만이 네덜란드인 정도로 보인다. 허나 Director급(부장, 이사 급) 이상을 보면 네덜란드인 비중이 상당히 높다. 훨씬 더 로컬한 회사인 경우는 이런 현상이 더 심하지 않을까 한다. 어떻게 보면 외지인으로서 ‘유리천장’을 좀 일찍 확인한 것 같다. 사실 아직 승진 프로세스를 진행해 본 적도 없고, 평가가 나쁘지도 않은 상황이지만, 이직 후 1년 반 동안 내 생각보다 업무 성과가 잘 보이지 않아, 자신감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더 부정적인 느낌이 강한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에서의 생활이 재미있긴 힘들다. 나는 여지껏 거쳐온 두 직장에서, 일이 힘들 때는 많았어도, 항상 ‘재미있었다’. 재미가 없으면 재미있는 일을 찾아다녔다. 그러나 요즘 벌써 ‘재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온다.
다행히도 유럽에 있는 네덜란드에서 ‘해고’는 쉽지 않다. 그러나 출근하는 게 즐겁지 않으면 삶이 즐겁지 않는 것과 같다고 본다. 아무리 야근이 없는 네덜란드라고 하지만, 하루 24시간 중 1/3은 회사에 있다. 이 시간이 즐거워야 삶이 즐거워 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사무실에서의 시간이 즐거워질까? 사실 아직까지 ‘일을 잘해서 성과를 내야지!’ 외에는 답을 찾진 못했다. 이 답도 지속가능한 답은 아닌 것 같다. 20년 동안 계속 성과를 잘 내긴 쉽지 않을테니까. 그래서 결국은 ‘내 일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재미있는 점은, 한국에 있는 직장인들도 많이들 이 생각을 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에 있으나, 네덜란드에 있으나, 살아남는 것에 대한 고민은 똑같고, 그 최종 종착점도 비슷해 보인다. 다만 내가 가진 장점/단점이 환경(국가,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함께 달라진다. 정답은 없다.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환경(이민 환경)을 파악하고, 이 환경에서 내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한 후에, 나름의 해결책을 도출한 후 기회를 찾는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수천 km를 날아와서 연고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다. 그런데 내 고민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예측 불가능한 것들을 삶의 ‘재미’라고 해야 할까?


